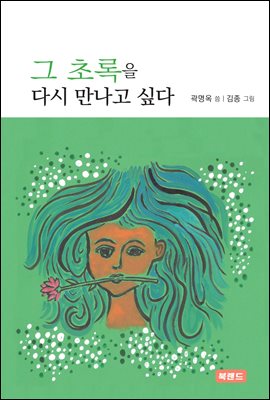강아지와 아기염소가 쓰는 서사시
- 저자
- 고재동 저
- 출판사
- 북랜드
- 출판일
- 2021-06-30
- 등록일
- 2021-09-24
- 파일포맷
- 파일크기
- 24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안동 선돌길 언덕에서 시인이자 수필가인 고재동 작가가 보내온 순박하고 독특한 느낌의 산문집, 『강아지와 아기염소가 쓰는 서사시』.
석 달 전에, 아기염소가 강아지만 있던 우리 집에 살러 왔다. 그때부터 써온 글이 모두 90편이다. 1부 한 달- 산이 품은 돌배, 2부 두 달- 시가 열리지 않는 나무, 3부 석 달- 앉은뱅이꽃 서서 걷다, 이렇게 정다운 부제가 붙은 각부에 그믐날의 이야기 서른 편씩을 담았다.
세상 걱정하는 강아지와 아기염소, 이 어린 동물 둘의 입을 통해 들려주는 이야기와 참 고운 시 한 편을 같이 묶은 특별한 형식의 고재동표 산문이다. 전원생활을 하며, 정치 문화 사회 환경 경제문제 등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강아지와 아기염소의 순진하고 정감 넘치는 말투가 참 읽기 좋다. 하지만 두 어린이의 얘기에 좀 더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짧은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올곧은 식견과 희망에 대한 바람이 깔려있음을 알게 된다. 언뜻 보아 재미난 동화집 같은 이 책이 사실은 순수하고 청고한 안동 선비인 작가의 세상을 살피는 곡진한 마음이 깊이 스며든, 일종의 서사 시집이기 때문이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있기나 한 거야?
비 갠 뒤 전깃줄에/ 참새 한 쌍 앉아 논다// 고개 돌려 마주 보며/ 까르르/ 째째짹짹 // 저들도 둘이 하나 되는 날/ 있을 거야/ 아마도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인데도 누나네 아빠는 어젯밤에 일 나가시고, 엄마는 컨디션이 안 좋다며 일찍 잠자리에 드시는 것 같던데, 맞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강아지와 아기염소가 쓰는 서사시 敍事詩’를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진정 그런 세상이 있다면, 진정 그런 세상이 온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마침표 찍을 수도 있을 텐데 말이야. 그럴 줄 알았어. 둘이 하나 되는 날인데도 누나네 주인 아빠, 엄마 혼자 두고 일 나가시더라니… 차가 말썽을 부렸다면서? 오늘 지인 결혼식이 있어 두 분 함께 대구를 가시기로 돼 있거든. 그런데 새벽녘에 차도 없이 걸어 들어오시더라니까. 나도 깜짝 놀랐잖아. 그런 적이 없었거든. 차를 시내 정비소에 두고 오셨나 봐?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일 나가시지 않았으면 차가 멈춰 서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우리 주인 아빠, 벌 받은 거야. 언제 정비 끝내고 대구 결혼식에 갈꼬?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열리면 매일 부부의 날일까? 오늘 새 출발 하는 젊은 부부는 매일 부부의 날이기를…. (-「공정과 상식」 전문)
각 편에 삽입한, 소박하고 아름다운 서정시가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쉼표를 찍듯 신선한 감동을 안겨준다.
봄볕을 캤다/ 마른 소나무 가지로/ 땅을 파헤쳤다/ 3년 전/ 땅따먹기에서 확보한/ 금 그어놓은 땅이다/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맨손으로 땅을 팠다/ 어깨 뒤에서/ 봄볕이 응원을 보냈다/ 드디어 봄볕의 주먹만 한/ 봄볕이 땅속에서 나왔다/ 향이 짙다/ 얼마나 절실했으면/ 지축을 뒤흔들까/ 봄볕은 처음부터/ 더덕이었나 보다 - 「4월, 더덕·1」
‘…그러나 나무가 산에 애걸하여 곁을 얻어낸 건 아니다. 다람쥐 한 마리, 산비둘기 한 쌍, 구구구 산속에 들어 나무를 매개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에 붙박이로 서 있길 작정한 것뿐이다.(「앉은뱅이꽃 서서 걷다」 중)’라는 시구절에서 보듯 『강아지와 아기염소가 쓰는 서사시』에는 ‘세상이 평화의 토대 위에 바로 서길 바라는’ 작가의 떳떳하고 꿋꿋한 마음이 곳마다 들어 있다. 자연 속에서 뛰어놀면서 배운 동심의 맑은 감성으로 재미난 이야기 속에 조금 따끔하면서도 따뜻한, 바른 삶의 충고를 담아 들려주는 『강아지와 아기염소가 쓰는 서사시』를 함께 들어보자.